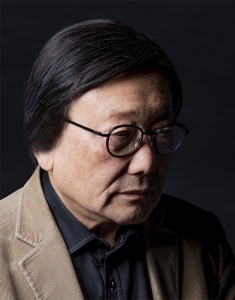원효(元曉)와 산의 일깨움—경북신문 6월 28일
산과 가까운 마을에 이사를 온지 열두 해가 넘는다. 서재도 집 가까이에서, 최근에는 아예 같은 아파트 옆 동의 원룸으로 옮겼다. 집(큰방이 서재)에서도, 별도의 서재에서도 창밖이 바로 산자락이다. 산을 바라보고 이따금 오르기도 하지만, 그냥 바라보거나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를 들여다보고 오르내린지도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은 고층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콘크리트 밀림’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런 곳이지만 산발치의 언덕아파트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이 이따금 느린 걸음으로 슬며시 다가서는 느낌을 주는가 하면, 때로는 그 품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게도 한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길을 고르기에 따라 범상하지만은 않은 즐거움도 안겨준다. 여러 가지 빛깔과 무늬들을 빚으면서 마음에 또 다른 산을 앉혀 놓게도 한다.
콘크리트숲 속에서 메마르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반대편에 놓이게 하는 오솔길들을 열어줄 때도 있고, 그 넉넉한 품안으로 회귀하려는 마음의 움직임까지 받아들여준다. 자연으로서의 산이라기보다는 그 이미지의 무게나 깊이가 마음에 들어와 앉으면서 새삼 신선하게 자리매김을 한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한다.
모든 변화를 묵묵히 감싸안아주는 산은, 어쩌면 그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마음을 슬며시 부추겨주는지도 모른다. 산들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거기 그대로 앉아 나무와 숲, 바위들을 포용하고, 날짐승들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품어준다.
서로 끌어당기듯이 다정한 무덤들도 거느리고, 중심과 균형감각을 갖게 하는 ‘추’ 하나를 드리워 준다는 느낌까지 안겨준다. 자연과 친화의 세계를, 때로는 그것에로의 회귀를 말없는 말로 웅변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은 때때로 아주 조그맣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견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도 한다.
숲에서 바라보면, 가슴을 서늘하게 틔워 주는 풋풋한 공기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앉아 있는 풀꽃에 눈길을 머물게 할 때도 있고, 조그마한 풀잎이나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야생초들을 들여다보면서 생명에 대한 신비감과 외경심이 깨어나기도 한다.
신라 고승 원효(元曉)는 “스스로 마음속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해 보라”고 했다. 그 자세에 대해서도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고도 일깨웠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커 보이는 원효는 이처럼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맑고 밝은 눈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불꽃과도 같은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잃지 않았던 원효는 큰 산과 같은 자부심을 안으로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는 마치 누운 풀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높이 날아오르는 봉황의 기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기슭에서 낮은 소리로 지저귀는 작은 새의 행복마저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대들보’이며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할 정도로 안으로는 완강한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바람에 눕는 풀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던 지혜와 혜안(慧眼)은 우리를 새삼 부끄럽게 만든다.
욕망과 이기심, 인간성 상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원효의 이 같은 일깨움과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세파에 휩쓸리며 자만과 편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성해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기다림과 목마름, 그것들을 뛰어넘어 더 나은 데 가 닿으려는 몸부림의 연속일는지 모른다. 산은 언제나 거기 그대로 앉아 ‘낮으면서도 높은 꿈’을 꾸게도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서 꿈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오솔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창밖의 산을 바라보면서 원효의 일깨움에 새삼 마음 가져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