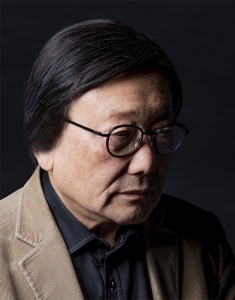꿈꾸기, 그 번짐과 스밈
—김건화 시집 『손톱의 진화』(북랜드, 2019)
ⅰ) 김건화의 시詩는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꾸기다. 그 꿈은 밖에서 안으로 스미고, 안에서 밖으로 번지는 ‘번짐과 스밈의 미학’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실 초극超克의 길을 트고 닦으려는 데 주어진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분방하게 오르내리는 그의 상상력(환상)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우주감정宇宙感情을 거느리면서도 가시적인 현실의 파토스Pathos들을 끌어안아 다독이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다다르고 싶은 불가시적 이데아Idea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다채로운 은유隱喩의 옷을 입고 있는 그의 언어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이 복합적으로 교차되거나 어우러지는 가운데 정신이 볏을 세워 존재의 비의秘義에 다가가고, 이상적인 세계에 다다르려는 꿈에 부단히 불을 지핀다. 그의 서정적 자아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부정교합不正咬合과도 같은 아픔과 이질감(소외疏外)을 은밀하게 관용寬容과 화해和解의 미덕으로 감싸는 한편 내면에 잠재된 야성野性 일깨우기로 활력을 얻으려 하기도 한다.
ⅱ) 시공을 초월하는 시인의 우주감정은 지금․여기에서 천년을 거슬러 오르고 내리는 상상력(환상)을 동반한다. 「천년을 탁본하다」에 묘사되듯, 잠시 비를 피해 들어선 절집의 처마 아래 피어 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연향인 그대 손길은 / 먼 기억 속으로 번진다”면서 그 공간에 “원앙금침 아래 누울 초야”도 떠올려 포개놓는다. 그것도 “베개 마구리에 새기던 무늬가 / 먹빛 침묵으로 하늘을” 보는 것으로 그려지며, 신라新羅까지 거슬러 오르는 환상은 ‘먹먹함’으로 규정된다.
시인은 불가시적이지만 ‘그대 손길’로 느껴지는 ‘연향蓮香’을 수묵水墨으로 박아내려 하며, 그 탁본拓本으로 연꽃무늬 와당瓦當뿐 아니라 ‘천년의 미소’로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의 의미까지 담아내려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여기서의 절집 처마 아래의 연꽃이 뿜어내는 향기가 까마득한 옛날의 연꽃무늬 와당을 넘어 그윽한 미소를 머금은 신라인의 얼굴무늬 와당의 불가시적인 이데아까지 끌어당기는 환상으로 나아간다.
먹먹함에 결 고운 한지 얹고
당신 무심의 심장을 향해
탕탕! 솜방망이로 두드리면
빙그레 웃는 수막새를 만날 수 있을까
—「천년을 탁본하다」 부분
이 한지韓紙 탁본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신(그대) 무심의 심장”이라는 대목이 암시하듯이, 그 연꽃향기가 거느리는 ‘무심無心의 경지’까지 담아내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 수막새의 미소는 천 년 전에 “절반을 나누어 가졌던” 미소로, 이미 아득한 세월 동안 화자의 “서늘한 기억”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여긴다. 아마도 그래서 시인은 이런 꿈에다 미래를 향해 “손바닥 깊숙이 / 버들문양도 새긴다”고 보태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우주감정과 시공을 초월하는 환상(상상력)은 그의 시에 은밀하게 관류貫流한다. 때로는 안에서 밖으로 번지고, 그 바깥이 다시 자연현상이나 우주로 퍼져나가며, 때로는 그 확산과는 반대방향으로 끌어들여지고 스며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의 시는 이같이 내면의 심상풍경心象風景과 외부로 열려 있는 세계(자연이나 우주)가 상호 번지고 스미는 ‘스밈과 번짐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미학이 바로 시 쓰기의 지향과 추구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요체要諦가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같은 암시의 일단은 역시 ‘그대’로 지칭되는 이데아에의 지향을 노래하는 「개심사 왕벚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나를
개심사로 불러들인 그대
쇠북에 등지느러미 꿰인 물고기
단청 속에 숨겨 놓고
주위의 벌들까지 들뜨게 한다
<중략>
꽃잎마다 봄을 앓는 열병
갈피갈피 접어놓은 그대 향한 길
참으로 멀기도 하여라
—「개심사 왕벚꽃」 부분
개심사開心寺와 ‘그대’로 지칭되는 왕벚꽃이 환기하는 이미지를 아우르면서 이 시인의 시적 지향을 시사하는 이 시는 왕벚꽃이 개심사로 화자를 불러들이고 그 속에 들어 주위의 별들과도 함께 들뜨는 열망의 길을 나서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멀고 먼 길임을 절감하게 되는 건 그 정황情況이 ‘그대(왕벚꽃)’가 쇠북(종)에 등지느러미가 꿰인 물고기를 단청 속에 숨겨놓은 데다 그 꽃잎들마저 ‘봄을 앓는 열병’을 갈피갈피에 접어놓고 있는 바 그 비의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시인은 왕벚꽃처럼 절정絶頂을 향한 열병을 앓으면서도 그 이데아에 이르는 길은 멀 뿐이라는 한탄恨歎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한탄은 “그대를 향한 길”에의 열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역설적逆說的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은유는 이 시인의 시를 향한 부단한 열망과 지향을 에둘러 떠올리는 경우에 다름 아니기도 하다.
그래서 이 열망과 지향은 “뒤척이던 불면의 여파가 // 눈꺼풀에서 발끝까지 번”(「파종하다」)지게 하고, “어둠 속 오래 걸어온 발이 // 발아하고 싶어 간지러운 / 푸른 봄밤”(같은 시)을 끌어안게도 한다. 그런가 하면, 그의 시적 지향은 보다 완강한 의지意志로 구체화되고, 은유의 옷을 입은 상승 이미지를 대동하는 양상으로 길을 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둘둘 말아 싸던 김밥 뾰족한 산으로 세워볼까
들끓던 내 안의 잡동사니 감정들
꾹꾹 눌러 두었던 욕망들도
산봉우리 위 구름으로 날려볼까
김밥은 둥글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삼각김밥
오늘은 내 뾰족한 마음의 각을 덥석 물
삼각김밥이 먹고 싶다
삼각 틀에 눌린 차가운 밥이
김과 밥이 비닐을 사이에 둔 불편한 삼각관계
비닐 벗겨내자 불쑥 들이미는 모래의 산
모래의 웅성거림이 차곡차곡 쌓여
피라미드 같다고 해야 할까
—「삼각김밥」 부분
이 시는 ‘삼각김밥’에 착안해 자연으로서의 뾰족한 산과 인공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내면풍경을 투사投射하고 전이轉移하면서 시인 특유의 시적 지향을 암시한다. 김밥을 뾰족한 산의 형상으로 빚으면서 들끓던 잡동사니 감정들이나 억제했던 욕망들도 그 위의 구름처럼 흘러 보내려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잡다하고 불순한 감정이나 욕망들을 말끔히 날려 보낸(지우고 비운) 순수 이데아를 지향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삼각김밥은 ‘뾰족한 마음의 각’을 물고(품고) 있는 반면 시인은 그 김밥을 먹고 싶어 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이윽고 그 삼각김밥은 모래의 웅성거림이 차곡차곡 쌓인 피라미드 같은 존재로 환치換置(비약)되기도 한다. 게다가 밥, 김, 포장 비닐은 상호 불편한 감각관계에 놓이며, 밥은 그 관계(삼각 틀) 속에 갇힌 모래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은 순도 높은 이데아를 추구하면서도 그 이데아를 피라미드 형상으로 구축하는 내용물(밥⟶언어)은 수많은 모래같이 삼각 틀 안에 차곡차곡 억제(절제)된 채 쌓여 있다고 본다. 나아가 삼각김밥을 ‘뾰족한 산’으로, 다시 ‘모래의 산’(피라미드)으로 환치해서 바라보며, ‘밥⟶모래⟶언어’로 비약하는 은유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삼각김밥=시적 지향’이라는 등식을 빚는다. 시인의 상상력은 이같이 ‘내면세계나 심상풍경’(내포)들을 밖으로 확산시키면서 ‘삼각김밥이나 모래의 산(피라미드)’(외연)과 같이 거시적인 대상으로 바꿔 바라보면서 지향하는 바의 시법詩法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떠올려 보인다.
시 「구름부족에 들다」는 “허공의 지문을 새의 눈으로 읽는다”면서 “고도 높은 하늘에 자작나무를 세워 / 무지개를 걸어볼까”라는 대목이 말해주듯, 「삼각김밥」과는 또 다른 시법을 제시한다. 삼각김밥이 여기서는 하늘을 향한 자작나무로, 김밥 속의 밥(언어)은 자작나무 위의 무지개(언어)로 바뀌는 상승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공의 지문指紋”인 구름에 “새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눈으로 ‘구름=생각이 날아다니는 섬’이라는 인식에 닿는다. 게다가 “안개도 덩달아 / 구름부족의 일가”가 되기까지 하는 정황에 놓인다. 이 인식에는 시인이 빚고 있는 시가 허공의 지문이며 날아다니는 섬으로서의 구름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안개까지 끼어드는 ‘구름부족’이라는 사실을 환기喚起한다. 하지만 시인은 부단히 정신의 높이를 향해 나아가려 하며, 이는 시 쓰기가 바로 그런 추구와 지향으로서의 꿈꾸기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보이게 한다.
정신의 볏을 세우고
목울대 가둔 설움의 언어
연금술로 풀어내는 그대
<중략>
새의 귓속말쯤은 너끈히 받아 적는
그댄 영민한 시인이여
맨드라미 꽃대처럼
위풍당당 볏을 세우고
그대 여명 속에서 홰치는 날
깨어난 만물은
해 뜨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수탉처럼」 부분
자신이 아닌 타인을 끌어들여 기실은 자신의 시적 지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게 하는 이 시는 언어의 연금술鍊金術로 맨드라미 꽃대처럼 위풍당당 “정신의 볏”을 세우는 시인(타인)에 대한 예찬이면서 자신의 몫으로도 끌어당겨 놓는다. 여기서 시의 언어는 설움을 묻히고 있기도 하지만 “새의 귓속말”로 비유되는 존재의 비의도 너끈히 밝혀내는 언어이며, 정신의 볏을 세워 여명黎明을 밀어내고 만물을 일깨우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의 언어는 여명 속에서 홰치는 수탉처럼 만물을 깨워 “해 뜨는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시인은 바로 그런 영민한 견자見者로서 ‘존재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깨움과 결의를 안팎으로 떠올리고 각인하는 경우에 다름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ⅲ) ‘번짐과 스밈의 미학’은 어떤 대상을 만나든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공을 넘나드는 상상력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공간적으로는 안과 밖으로도 길항拮抗하듯 교차되는가 하면, 그 환상은 현실의 비애들을 끌어안아 다독이는 서정적 자아自我의 세례를 받게 마련이다.
‘무영탑無影塔’에 얽힌 이야기를 끌어들여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불국사佛國寺를 모티프로 한 시 「어느 날 홀연히」는 “백목련 꽃 핀 가지가 다보탑을 누를 때, 눈물로 벼랑을 살피는 동백은 무너진 석가탑이다”라는 은유로 시작되면서 아사녀를 향한 연민의 정서를 절절하게 풀어낸다. “다보탑 옆구리에 대고 내가 들은 것은 지아비 잃은 여인의 통곡 //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 지아비 그리며, 늘 단아한 지어미는 틀어 올린 머리칼을 흐린 하늘로 푼다”는 묘사가 그 절정이다. 시인은 이어 그 비애를 “서녘 하늘 언저리에 말줄임표를 남기고 새들은 또 날아간다”고도 그린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바깥에서 안으로 시선을 옮기면서는 자기성찰自己省察에 무게중심이 주어진다. 「오늘이라는 당신」에서 “구불구불 돌아다닌 에움길이 / 주렴 속으로 걸어 들어와 / 야금야금 발끝이 갉아먹은 자리에 / 통증의 꽃 구절초가 피”어난다고 그리는 바와 같이 시인의 일상적 삶은 고통스럽다. “앞만 보고 내달리던 / 스프링복의 질주본능이 낭떠러지를 만”나야 하며, 그 중압감은 ‘오늘’이라는 현재진행형의 삶의 현장이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곡선이 아치로 내려앉은 언덕
당신 납작한 신발 뒷굽에
구름스프링을 달아야겠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던
직립의 무게에 눌리고 눌린 탓에
주춧돌처럼 아픈 발의 비망록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한 번도 씻겨 주지 못한 당신 발에
슬며시 내 발을 포개보아요
— 「오늘이라는 당신」 부분
그런 ‘당신=오늘’의 고통은 발이 “직립의 무게에 눌리고 눌린 탓”이며, 그 무게로 납작해진 신발 뒷굽(뒤축)에 ‘구름스프링’을 달고 싶어지게 하고, 그 현실 속에 놓인 시인은 발을 “한 번도 씻겨 주지 못한” 자책감自責感에서도 자유롭지 않아진다. 이 때문에 자신의 발을 ‘오늘’의 발에 슬며시 포개본다는 은유를 통해 완곡하게나마 치유와 초극에의 의지를 내비치기에도 이른다.
한편 「새의 책상」에서의 화자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구입한 앉은뱅이책상과 마주하면서 그 재료인 모감주나무 심장의 두근거림까지 감지하며, 급제及第하지 못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글을 읽던 늙은 서생書生도 불러낸다. 또한 그 책상은 ‘날개 꺾인 새’에 비유되는 ‘서생’의 울음을 총총히 받아 적느라 밤을 지새운 새벽에는 “꽃피운 모감주나무가 하얗다”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시선으로 끌어당겨 들여다보게 한다.
시인의 상상想像은 이처럼 책상이 되기 전의 꽃핀 모감주나무와 그 나무에서 지저귀던 새, 책상의 주인공(서생)이 학도병으로 징집된 뒤 꿈이 좌절되는 정황까지 복합적으로 불러 모으는 한편 ‘급제하지 못한 서생=날개 꺾인 새’라는 등식을 통해 앉은뱅이책상의 내력을 비애의 환상 속으로 들어앉힌다.
이 비애의 환상은 돌쩌귀처럼 문짝을 다는 데 쓰는 장식에 닿아서도 젖은 날개를 달게 된다. 「무쇠나비경첩」에서 시인은 경첩을 “차곡차곡 쌓았을 슬픔의 무늬로 / 저승 갈 때 입을 한 벌 삼베수의 / 장롱 깊숙이 숨기고 있다”고 보는가 하면, 그 나비가 시커멓게 박쥐를 닮아간다고도 한다.
열고 닫히는 세상의 모든 경계에
모란꽃의 여백으로 얹어둔
시커먼 무쇠나비 한 쌍
슬픔을 머리맡에 둔 오랜 화두
합장으로 날개를 모았다
—「무쇠나비경첩」 부분
시인이 목도하는 무쇠나비경첩은 누군가가 저승으로 갈 때 입을 삼배수의壽衣를 깊숙이 숨긴 장롱欌籠에 박힌 채 삶과 죽음의 경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계”에 모란꽃(장롱의 장식)의 여백으로 얹혀 있는 존재다. 나비가 박쥐를 닮아간다는 대목이 암시하듯 쌍을 이룬 채 열고 닫히는 경계에 붙박인 나비경첩이 “슬픔을 머리맡에 둔 오랜 화두”로 불길한 징조를 대동한다. 하지만 시인은 경첩이 촉발하는 정서情緖와는 달리 꽃피는 봄날의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면서는
겹겹 동여맨 꽃잎 열어 만개할
화산 같은 내 안의 도화는
어찌 깨울까
<중략>
몸속 도화는 물컹물컹 짓무른다
불어온 실바람에 복사뼈 자리
진물은 찔끔찔끔
지나가는 개미를 가둘 뿐
내 안의 도화는 잠들지 않는다
그대여 더는 꽃망울 움츠리지 않게
달그림자로 숨어들어
꽃망울 활짝 터트려주오
—「도화를 깨우다」 부분
라는 기구祈求로 방향을 전환한다. 봄이 오자 북숭아꽃이 만개하지만 화자의 몸속에서는 짓무르는 정황을 대비하면서도 개화開花에의 소망을 접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화稻花의 꽃망울이 화산火山 같은 폭발력을 예비(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록 몸속(내면)의 도화가 짓물러 그 진물에 벌이 아닌 개미가 찾지만 ‘그대’가 활짝 터트려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붙들면서 기구하게 된다. 이 기도의 자세는 절대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초극의지의 발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소망의 전언傳言은 눈 내리는 겨울이라는 상황과 가지가 꺾인 채 찻집의 벽면에 장식된 망개나무의 빨간 열매를 끌어들여 “변두리 찻집 우울의 모서리를 밝히는 / 뿌리를 버리고도 살아있는 / 환한 꽃등”(「모서리 장식론」)이라고 노래한다든가, 「건포도를 읽다」에서 포도를 “먼 땅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온 / 햇빛과 바람이 낳은 사생아”라면서도 건포도를 “닳은 지문으로 문지르”며 “몸을 빠져나간 씨앗들은 /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 잇몸 붉은 새들을 어르기도 할 거”라는 발언發言 등에서도 읽을 수 있다.
ⅳ) 그렇다면 환상을 통한 초극이나 초월 꿈꾸기 이전의 지금․여기에서의 일상적 현실은 시인에게 어떤 빛깔로 각인되고 있는 것일까. 햄버거를 선호하는 작은딸과 떡메로 친 인절미를 좋아하는 아버지(남편)의 ‘황소고집’으로 집안은 살얼음판이 되기도 한다는 「독립선언」, 분식집 라면을 먹고 싶은 ‘나’와 청양고추 듬뿍 썰어 넣는 ‘당신’(남편)은 주의와 주장은 다르더라도 라면을 좋아하는 ‘이질성 속의 동질성’을 희화적戱畵的으로 그린 「라면 먹고 싶은 날」 등은 가족의 소소한 애환과 갈등을 그려 보인다. 하지만 바깥 활동에만 무게가 실린 남편과 집안일에 매달려야 하는 전업주부 사이를 이화부부異化夫婦처럼 묘사한 경우도 없지 않다.
.
집으로 들어서는 낯선 남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더니
익숙하게 침대에 누워 코를 곤다
여전히 여자는 달의 뒷면
다른 별에서 온 남자와 여자는
동문서답의 기찻길을 간다
남자는 여행 가방을 싸고
달팽이집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움츠린 어깨를
더 깊어진 거울 속으로
밀어 넣는다
—「낯선 별에서」 부분
전형적인 가부장제家父長制 가정을 무대로 한 듯한 이 시는 여성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극화劇化하고 있다. 귀가하면 익숙하게 일찍 곤히 잠자는 남편이 낯설어질 정도여서 여자(아내)는 ‘달의 뒷면’일 수밖에 없으며,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동문서답의 평행으로 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출근을 서두르는 남편을 여행 가방을 싼다고 하고, 집에 남아야 하는 아내는 소외감으로 위축된 채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하겠는가.
이 같은 정황 속의 화자의 심경心境으로는 “하루의 각질로 푸석이는 저녁 / 불빛 경계에 쓴 자서전은 / 저마다 어둠의 육필이다”(「곡진한 불빛」)고 토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더욱이 화자에게는 일상적 현실이 “붐비는 동성로 걸어 보아도 / 저문 신천 강물 옆구리 끼고 달려도 / 나를 유배시키는 섬”(「우울한 허밍」)이라고 느끼게 하고, 그 유배는 “출구를 찾지 못한 새인 양 / 유리창에 이마를 부딪”(같은 시)게 된다는 아픔도 비켜설 수 없게 할 것이다.
현실에 대한 파토스는 「울을꽃 터지다」에 이르면, 활짝 피어나 오래(백일 동안) 지지 않는 배롱나무 꽃을 “한꺼번에 터진 대성통곡”으로 읽게 되는 바와 같이 극대화極大化된다.
끓어오르는 화산처럼
오장육부를 남김없이 뱉어내려
밤낮없이 울부짖는 꽃
막무가내로 쓰는 생떼
대개의 생은 저렇듯 처절하다
—「울을꽃 터지다」 부분
붉게 핀 배롱나무 꽃을 남김없이 오장육부를 뱉어낸 ‘울음꽃’과 ‘막무가내 생떼’로 규정하는 건 시인의 내면 투사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개의 생은 저렇듯 처철하다”고 자신뿐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까지 확대해 놓는다.
이 같은 비관적悲觀的 시각은 “다정과 냉정 사이 / 고쳐 맨 신발 끈이 풀려 / 진흙 구덩이에 빠져 / 얼마나 갈팡질팡했었나”(「수요일의 여자」)라고 자신의 어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일은 또 내일을 만들어 / 기다림이란 낯선 역에서 / 하염없이 긴 목을 늘”(「어설픈 관계」)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게도 한다. 겨울 탱자나무를 보면서도 “상처로 키운 가시가 손톱 밑을 파고들어 / 채워지지 않던 내 안의 궁기 / 먹빛으로 혹한을 견뎌야 했다”(「가시의 내력」)는 토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현실과 꿈의 괴리감은 마치 아래와 위턱의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의 치아 같아서이기도 하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도 장마 때와 같이 종잡을 수 없는 세상(세태)의 변덕 때문이지 않을까.
검은 손바닥 구름들 음모가 수상하다
적막을 깨뜨리는 야생의 말발굽 소리
투구로 무장한 적들이 몰려온다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던
유순한 한 남자가 들어 올린 도끼날이
허공에서 번쩍이며 내려온다
<중략>
소란도 잠시, 장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서진 우산살만 남기고 담장 위로 올라가 능소화 피웠다
손바닥 구름 쓸어낸
짙푸른 나무의 몸통에서 매미 울음은
더 요란해졌다
—「장마」 부분
‘비구름’을 손바닥 뒤집듯 수상한 음모를 하는 ‘검은 손바닥 구름’으로 읽는 시인은 천둥과 함께 쏟아지는 소나기를 투구로 무장武裝한 적敵들이 야생의 말을 타고 몰려오는 것으로 보는가 하면, 번개를 유순柔順하고 두려움이 많은 한 남자가 도끼날을 번쩍이며 내려오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다시 하늘이 말끔히 개는 변덕을 부리면 ‘부서진 우산살’(상처)만 남길 뿐 담장 위에는 능소화가 피고 짙푸른 나무에서 매미 울음이 더 요란해지니 장마가 수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냉장고 속의 양파를 “아마포를 두르고 관 속에 누워 / 매운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썩음은 생명의 본능에서 풀려나는 것”(「썩음과 놀다」)이라고 얼마간 누그러지면서도 “수없이 방부제를 삼킨 내 몸은 / 냉장고 같아서 언젠가 썩을 날을 / 얼마간 더 유보할 뿐이지”(같은 시)라고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며 여전히 비관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진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붙잡듯 “젖을수록 질긴 무명 같”(「그녀의 율도국」)은 끈질김으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앞에서 / 징검돌 하나 놓고 기다리”(「구름 속 댓글」)게도 된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외딴 섬으로 떠도는
너와의 거리를 좁혀 볼 궁리로
섬인 내가 섬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서로의 거리 여울진 물결로
가득 채웠다
<중략>
더는 쓸쓸하지 않은
내통을 위해
깜박깜박 등대 하나
세워둔다
—「간극間隙」 부분
시인은 이처럼 ‘섬’(나)과 ‘섬’(세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물결로 채우고, 내통을 할 수 있게 등대를 세우는가 하면, “달력에 빨간 꽃 그려 놓고서야 / 마법에서 막 풀려”(「그 여자가 사는 법法」)나게 되기도 한다. 뿐 아니라 꼬막을 캐며 진흙 바닥 헤맨 어머니의 오십 년 세월의 사투를 떠올리면서 “무릎 꺾인 석양에게 마지막 온기를 / 온몸으로 쏟아 부을 나는 널배 밀러 간다”(「널배를 밀다」)는 결의까지 보여준다.
이 결기는 “삶은 빨래 / 탈탈 털어, 율도국의 햇살 아래 널 때 / 그녀의 나라 백색 깃발은 / 환한 눈빛 기도로 맑아”(「그녀의 율도국」)지는 이상향에의 꿈과도 접맥되기 때문인지 모르며, 「아카시아」에서처럼 “가시로 무장한” 채 “말의 향기로 나비를 부”르는 현실 대응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ⅴ) 시인은 현실의 아픔과 소외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없지 않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함몰되지는 않는다. 순리順理를 거스르지 않는 화해와 관용의 미덕을 은밀하게 품으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꾸기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트려 한다. 어렵더라도 “출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 가시 밧줄로 낮게 기어온 골목이 / 내 몸을 관통한다”(「막다른 골목」)거나 “출구를 찾지 못한 물은 / 내 안의 살아있음의 증거들”(「단절과 간절 사이」) 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마음눈을 돌리게도 된다. 심지어 ‘달팽이관’으로 여기기도 하던 자신의 거처居處(집)를
고층 아파트 꼭지층은
두둥실 구름의 방이죠
<중략>
구름의 방에 들어요
은둔자의 섬에서 빠져나와
커튼 없어 좋은 방
—「전망 좋은 방」 부분
이라고 밝게 그린다. ‘달팽이관’이나 ‘은둔자의 섬’에서 일탈해 단절(커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구름의 방’에서 전망展望을 자유자재로 조망眺望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허기진 내 영혼의 집이자 밥인 / 이팝나무 둥치에 / 구름 그넷줄을 단단히 동여맨다”(「이팝에 들다」)는 은유로 완강한 결의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물들다」에서는 시집 갈피의 바스러지기 직전인 은행잎을 들여다보면서 “다정과 냉정 사이 오가던 은유가 부챗살로 번진다”는 생각에 닿는가 하면, 그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처럼 까마득할지라도 “너에게로 번지려면 서로의 경계를 지워야 하지 // 물이 든다는 것은 서로에게 스미는 것”이라는 관용과 화해의 미덕을 떠올려 보인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어디에 연유緣由하고 있는 것일까.
비스듬히 등 눕히던 소파에서
성난 물소 콧김 내뿜는 소리가 들린다
<중략>
비스듬히 누워 졸고 있다가
누군가 불러낼 강물 같은 전화벨 소리에
코를 벌름거리며 귀를 쫑긋 세운다
다시 깨어날 야생을 위하여
—「소파」 부분
아마도 관용과 화해의 이면裏面에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야생野生에의 꿈’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는 편안하게 졸면서 소파에 등을 기대어 눕히고 있지만, 그 물소가죽 소파의 본래적인 야성을 감지하게 되는 데다 자신의 내면에 잠재돼 있던 야성을 “강물 같은 전화벨 소리”가 일깨워주는 촉진제가 되어주는 게 아닐까. 그 일깨움도 순리에 따라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비유된다. 시인이 이르는 여기서의 야생은 더 나은 삶에의 꿈이며, 그 꿈꾸기는 시를 쓰는 행위와 연계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시인에게 있어서의 야생은 본능本能과 원초적인 생명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이기」에서의 “내 몸에 스위치를 올려요”라거나 “심장을 마구 달구어 봐요”라는 구절은 드라이기의 작동을 이르면서도 자신을 향해 있으며, 이는 “젖은 영혼을 달래”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구의 도움 없인 다 채울 수 없는 / 원피스 뒷단추는 여자의 넝쿨 심리다”라고 시작되는 「단추의 배후」는 절제된 본능을 “얌전하게 채워진 단추 간격 사이로 / 들뜨는 가슴은 꼭 눌러 두어야 할 관능”이러고 밝히면서
한 번도 폭주를 꿈꾸지 못한 내게
목 위까지 꼭꼭 채운 단추
슬그머니 풀어주는 사람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단추를 여미는 데 급급했던가
—「단추의 배후」 부분
라고 되돌아보는 한편, “옷 바꿔 입을 생의 환생 구간”이 될 때까지 단추들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두지 말기를 소망하는 마음까지 감추지 않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시집의 표제시인 「손톱의 진화」는 그런 심경을 원초적 감정의 옷을 입혀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첫눈 내릴 때까지 남아 있는
봉숭아 꽃물 든 손톱에서
기다림 노을은 여러 번 익었다
잊을 만하면 몸 밖으로 자라는
가시 때문에 여자들은
손끝이 근질거려 바가지를 긁고
일확천금 꿈꾸는 자는 복권을 긁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물의 본능으로
칼로 물 베는 싸움에서
손톱 함부로 세우기도 하지만
슬픈 진화일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손톱일수록
더 진한 매니큐어가 칠해지고
그 다양한 색깔만큼 아픔들이
절망의 손톱 위에 덧칠해질 때
손톱의 난해한 은유는 풀기 어려워
그 옛날의 등 긁어주던
어머니의 뭉툭한 손톱이
나 무척이나 그리운 이유
—「손톱의 진화」 전문
손톱과 손톱 물들이기의 함수관계를 여성 특유의 감성과 언어감각으로 희화화한 이 시는 봉숭아 꽃물 든 손톱에서 매니큐어를 짙게 덧바른 손톱까지의 “슬픈 진화進化”를 그리고 있다. 상당기간 지워지지 않는 봉숭아 꽃물은 순수한 손톱 치장治粧이지만, 짙은 매니큐어는 상처를 주고받은 여성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남편(또는 누구나)에게 바가지를 긁거나 손톱을 함부로 세워 상처를 준 경우일수록 더 진한 매니큐어가 칠해질 뿐 아니라 아픔이나 절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색깔이 매니큐어가 덧칠된다는 논리다. 그야말로 난해한 ‘손톱의 진화’에 대한 은유다.
여자는 치장으로 봉숭아 꽃물을 들이고 기다리다 자라나는 가시 때문에 바가지를 긁게 되기도 하고, 칼로 물 베기라는 부부싸움 때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함부로 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동물적 본능 때문이지 이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짙어진 손톱의 매니큐어에 대한 자성적自省的 시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도 옛날에 등 긁어 주던 어머니의 뭉툭한 손톱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 시는 통어通御된 야성을 돋우어 바라보기에 다름 아닌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시인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열망한다. 그런 삶에의 길 더듬기와 찾아 나서기는 시적詩的 지향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구는 “허공에 집을 짓는 호랑거미 / 거미줄을 쏘아 펄럭이는 우산살 집을 짓는다 // 공중그네 타고 구석진 모퉁이에 숨어 고르는 숨 / 먹잇감이 걸려들길 기다린다”(「호랑거미 시인」)는 대목에 시사되고 있으며, 사리舍利 같은 시를 쓰기 위해 “밤낮으로 씨줄 날줄 언어의 집을 짓는”(같은 시) 모습으로도 떠오른다
그 여정旅程은 물론 쉬울 리 없다. 매실주梅實酒를 담그고 “시고 떫은 청매실이 / 설탕이불 덮고 석 달 열흘 견디면 / 달콤한 내일이 기다리”(「백일기도」)게 되는 바와도 같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식탁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영화 속의 장면까지 부럽게 떠올리기도 하는 시 「식탁 혹은 신탁」에서 시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밥 먹듯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허기지면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삶 꿈꾸기로서의 시를 쓰려 한다.
그 ‘식탁’은 그래서 시인에게는 ‘신탁神託’으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것도 숙명宿命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말미에 이 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이 시인의 현재진행형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얼굴 반찬도 없는 싱거운 밥을 먹는다
영화에선 식탁에서 사랑도 하던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시를 쓴다
세끼 밥은 꼬박 챙겨 먹어도
시 한 편 쓰지 못한 날은 허기진다
살기 위해 밥을 먹는 식탁에서
남아 있는 밥그릇 숫자를 헤아려보는 시간
육인용 대리석 식탁이 거룩한 성소
신탁 같아서 참으로 징하다
오늘도 파지 나뒹구는 식탁에서
원고지 칸 메우듯
깍두기 같은 문장 서걱서걱 씹는다
—「식탁 혹은 신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