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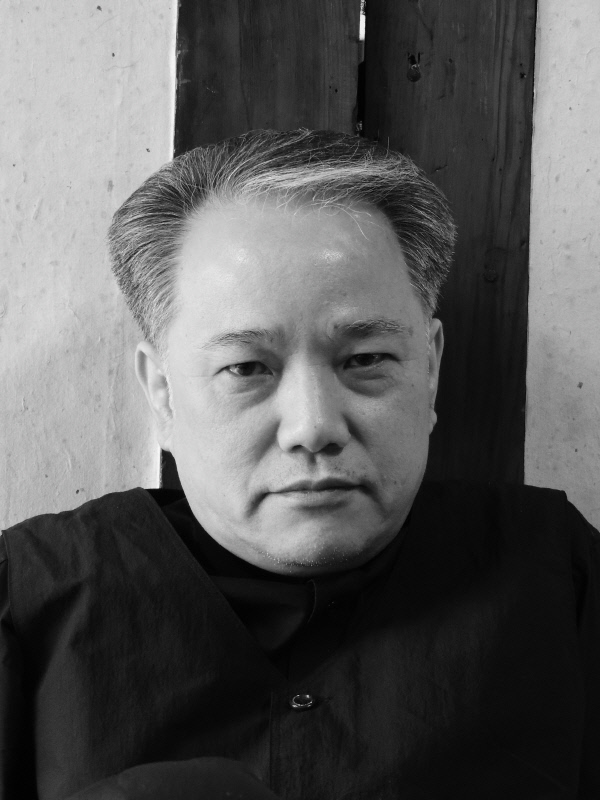
탁발승의 목탁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면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소년 이원동이 곡식이 든 바가지를 들고 대문 앞에서 스님을 기다리고는 했다. 불교를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마음 속 울림이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조계종 소속의 불교학생회 구도회에서 활동하며 불교와 더 깊은 인연을 맺었고, 대학 역시 경주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진학했다.
그리고 20여년 전 부모님이 귀천 했을 때도 이원동은 곡 대신 염불을 외웠고, 전통 있는 유교 집안의 꼿꼿한 어르신들에게 지청구를 들어야 했다. 첫 개인전도 그의 평생 화두인 ‘존재’를 주제로 한 채색 비구상 시리즈로 채웠다.
◇불교 수행자와 서화가의 일치된 삶
서화가로 살고 있는 석경(石鏡) 이원동(李元東·57)에게 작품 경향을 묻자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를 “깨달음을 향해 가는 세속에 사는 수행자”라고 소개했다. 서화를 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라고 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수행이 같다는 것. 마치 연리지처럼 그의 창작활동과 불교는 숙명관계다.
“불교가 전생에서부터 인연이었던 것 같다. 이유 없이 불교에 관심이 갔고, 늘 내 곁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실존을 찾으며 승려로 살고 싶었지만, 유교 집안의 장손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석경은 죽농(竹農) 서동균(徐東均)의 아들의 제자인 천석(千石) 박근술을 스승으로 했다. 고등학교 은사였던 천석의 영향으로 붓을 잡았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석경의 성장은 일찍부터 눈이 부셨다. 39세에 1998년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한국 서화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서양화와 달리 서예와 문인화가 최소 10년은 해야 이제 걸음마를 뗐다고 할 정도임을 감안하면, 첫 개인전 3년 즈음 이뤄낸 성과물은 빨라도 한참이나 빠른 것이었다.
서화가 석경의 삶은 서예대전 대상 수상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수상 이전에는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 작품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바퀴가 일으킨 ‘홍진(紅塵·붉은 먼지)’이 뒤덮은 세상처럼 번잡한 속세의 신변잡기를 섭렵했다. 하지만 서예대전 대상 수상 이후 그의 여정은 급선회한다. 대상 수상 이후 그에게 쏟아진 찬사와 관심이 ‘교만의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으로 바뀌어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대상 수상 이후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석경이 내린 결론은 스스로를 고독의 굴에 가두는 것. 속세에 살되, 고독한 섬처럼 작업실을 집 삼아 오직 기도와 수행과 작품 활동에만 전염하기로 결심했다. 청년시절 염원했던 승려의 삶에 대한 현현이었다.
이후 그는 지금까지 작업실에서 기거하다시피 하며 하루 서너 시간의 수면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오직 기도하고 수행하고, 작업만 한다. 은둔형 작가로 산지 20여년. 수행 단계마다의 토해낸 작품들이 산을 이루고도 남는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치열하게 수행하고, 농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호미로 콩밭을 하염없이 메지 않는가? 나 역시 부단히 서화에 매진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고 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작가의 숙명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석경이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추구해 왔다. 일단 그는 물감부터 남다르다. 일명 석경표 석채(石彩)로 그림을 그린다. 그의 석채의 주재료는 돌이다. 자연의 색이 스며있는 돌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해 여기에 아교 등을 섞어 물감을 만든다. 대나무와 소나무, 산과 바위 등의 자연을 그리는 그에게 자연에서 얻은 물감은 작품에 자유를 더한다.
“물가에서 자주 명상을 하곤 했는데, 그때 물 속 돌의 색깔이 오묘하다는 것을 느꼈다. 벽돌, 옹기 등에서 색을 찾다가 모래가 섞인 퇴적암 종류에서 명료한 색깔을 발견했다.”
글씨와 문인화를 두루 거친 석경의 걸작은 대나무에서 발휘되어 왔다. ‘대나무 작가’로 불릴 만큼 특히 대나무를 주로 그렸다. 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사시사철 굳건한 자세와 푸르름을 유지하는 대나무와 그의 대쪽 같은 성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의 대나무가 매력적인 것은 변죽 때문이다. 매번 전혀 다른 대나무를 화폭에 담아왔다. 지난해 열린 23회 개인전에서 댓잎과 가지를 생략한 대를 표현하며 대나무 그림의 획을 그었다. 굳이 그리지 않아도 대나무의 온전한 형태가 드러날 만큼 대가의 경지가 묻어났다.
40여년 서화가의 삶. 1년에 최소 한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23번의 개인전을 펼치며 1천여 점의 작품을 출산했다. 그의 성실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이 모든 결과에는 ‘치열한 노동’이 배어 있다. 작가는 ‘노동’을 ‘수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돌을 쪼개서 물감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지난한 노동이 개입된다. 전시 전에 액자를 하는 것도 표구사에 맡기지 않고 다 내가 직접 한다. 여기에도 힘든 노동이 들어간다. 대작 위주의 작품을 그리는 과정 또한 노동의 집적이다.” 석경이 이처럼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동심’ 때문이다. 그는 “지난한 노동이 곧 수행이다. 치열하게 노동을 하면 고뇌와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며 “그 과정이 반복되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
| 이원동 작 ‘매화도’ |
◇ 검은 ‘매화도’로 24번째 개인전
해마다 석경의 개인전 소식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쫑긋한다. 매번 전혀 다른 화풍을 보여주며, 혁혁한 변화를 보여 준 그의 또 다른 변신에 촉각이 곤두서기 때문이다. 그는 “변화는 공부가 단계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확장이며 진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저에 ‘두려움 없는 성정’이 있음을 귀띔했다.
석경은 “나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큰 힘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작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고, 혁혁한 변화도 지를 수 있다”며 경지에 이른 내공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9일에 수성아트피아에서 24번째 개인전이 시작됐다. 이번 전시에는 매화가 주제다. 켜켜이 쌓은 부조를 만들고 그 부조(浮彫) 위에 매화를 조각한 틀을 얹어 떠 낸 작품에 석경표 석채(石彩)로 채색을 더한 매화도가 수성아트피아 벽면에 걸렸다.
특히 온통 검은 먹으로 채색된 매화 대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검은 색은 화려한 매화 위에 한번 더 덧칠한 결과다. 아치고절(雅致高節), 매화의 높은 절개가 검은 묵으로 살아 꿈틀댄다. 마치 깊은 침묵이 평화로운 피안(彼岸)의 세계 같기도 하고, 욕망과 화려함이 뒤섞인 차안(此岸)의 세계 같기도 하다. 극과 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묘한 검은 매화다. 이 또한 극치의 경지다.
지난해 전시에서 잎과 줄기를 생략한 매화로 파란을 일으킨 것처럼, 검은 매화 또한 같은 경지다. 바로 욕망의 비움이다. “생과 사 사이의 존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각각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색채와 형상들이다.”
이번 전시에는 원형의 부조 위에 틀로 뜬 매화작품도 함께 걸려있다. 원형은 석경이 전시에 자주 활용하는 형태다. 이 역시 불교와 관계 깊다. 불교에서 원형은 완전함을 뜻한다. 완전한 존재를 찾아가는 고독한 수행자 석경의 전시는 4월 3일까지 수성아트피아 전시실 전관에서. 053-668-1566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